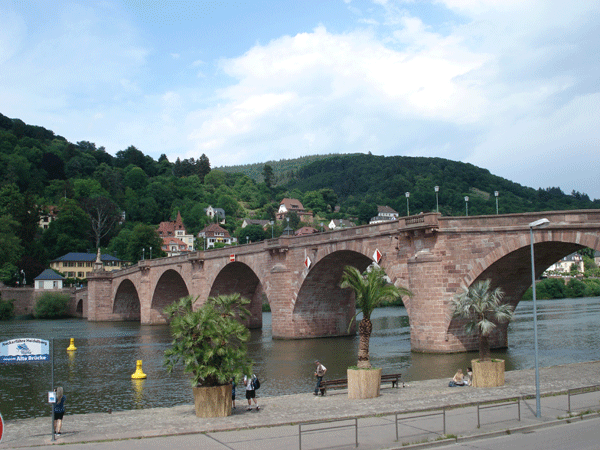▶ 수필가 방인숙의 동유럽 여행기 ①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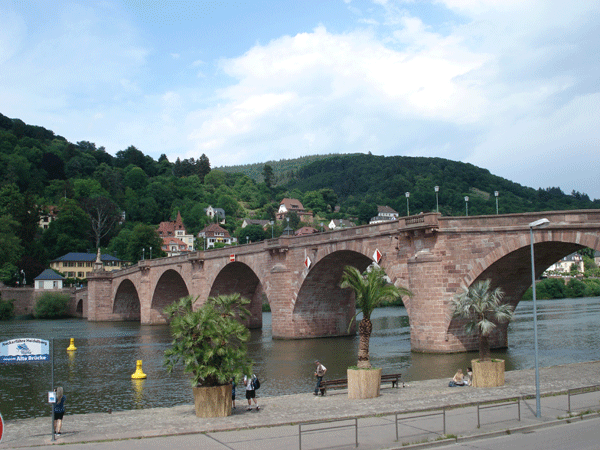
하이델베르크의 전경

하이델베르크 성
17만명 시 인구 중 2/3가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연관
작은 오솔길 ‘철학자의 길’ 칸트 등 숨결 느껴
700년 역사 하이델베르크성 세월의 무게 견디고 우뚝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때에, 나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의 정의’라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선언했다. 나도 진정한 자유의 열망이 절실해지는 나이도 한참 지났다. 그래서 학창시절 때부터, 짝사랑처럼 대책 없이 꿈꿔왔던 동유럽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친구들 9명과 케네디공항에서 저녁때 탑승했는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내리니 아침이다. 런던의 히드로, 파리의 샤를르 다음으로 크다는 공항에서 접한 독일의 첫인상은, 실질적인 게 우선인 실속주의와 은근한 저력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나라의 얼굴인 공항의 쓰레기통이 종이, 플라스틱, 일반쓰레기로 나란히 비치돼있다. 또한 공항근무자들이 공항 안을 자전거를 탄 채로 바쁘게 오간다. 공항청사에 자전거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처음 봤다.
작은 중세도시라도 금융과 노동법이 강해 독일의 경제적인 수도라고 칭한다더니 빌딩숲이 만만찮다. 또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거리의 차들이 전부 벤츠, 아우디. BMW, 폭스바겐 등 막강한 독일군단들 뿐이다. 한국차와 일본차는 물론 미국차도 거의 눈에 안 띈다. 미국엔 타국 차들이 더 많고 한국에도 외제차가 많다는데, 독일은 철저히 자국제품만 쓴다는 방증이다. 우리가 반면교사(反面敎師)해야 할 국민성이다.
외곽으로 접어드니 예상외로 도로 폭이 좁다. 독일남부 중앙을 가르는 로마로 이어지는 길이란 뜻의 로만틱 가도다. 중세분위기의 도시들을 26개나 품고 있는데, 마인강이 흐르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알프스 산맥의 공기가 느껴지는 퓌센까지의 구간이 낭만적이라, 로맨틱가도로도 불린다. 과연 양쪽풍경이 연하지도 진하지도 않은 낭만적인 초록 들녘이다. 새파란 물결이 가없이 넓어 초록지평선까지 넘실댄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경이로운 초록의 만경창파(萬頃蒼波)에 허수아비대신 은빛의 키 큰 풍력발전기들이 화룡점정(畵龍點睛)이다. 처음엔 논인가 해서 뭉클 반가웠다. 허나 유럽에선 밭농사만 짓고, 이태리남부 극히 일부에서만 논농사를 짓는다니 아닐 거였다. 바로 보리밭과 맥주의 쓴맛을 내주는 홉(hop)밭이다. 우리가 예전에 숭늉이나 지금의 보리차대용처럼 맥주를 찾는 독일인들의 수요에 맞추려면, 저토록 무변광대(無邊廣大)하게 보리농사를 지어야할 거였다. 내 온몸에도 초록수액이 흐른다. 흔히 초록이 좋아질 때는 나이를 먹었다는 징조고 순리를 아름답게 받아들이라는 시기라지. 초록빛에 물들어 첫 여행길이 절로 더 싱그럽다.
독일의 예쁜 농촌정경이 다정하고 낙원 같다. 이리 평화롭고 숲이 보배인 전원적인 나라인데, 어떻게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타나 그런 끔찍한 광기를 부렸을까? 아이러니다. 솔직히 독일하면 그 옛날 TV에서 ‘전투(Combat)’란 미드를 보며, 나치의 전과와 무서움에 독일의 밑그림은 냉혈적이고 강성이미지였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색다른 그림을 걸어야 할 정도로 자연풍광의 양태가 오밀조밀 포근하다. ‘독일의 재발견’이다.
첫 관광지는 야생 블루베리가 지천이라 블루베리란 Heidelbeere와 산을 뜻하는 Berg가 합쳐진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다. 버스에서 '황태자의 첫사랑'(The Student Prince)이란 영화를 다시 봤다. 목소리만 출연했던 마리오란자의 “Drink Drink”란 우렁찬 후렴이 귀에 쟁쟁하고, 신분격차로 못 이룬 애틋한 사랑에 가슴 저렸던 느낌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하이델베르크는 네카강과 라인강이 합류하는 독일 서남쪽, 대학과 낭만의 도시다. 1386년 신성로마제국이 설립한 하이델베르크대학은, 체코의 프라하대학과 오스트리아 빈 대학 다음으로 역사가 깊다. 17만 명의 시 인구 중 삼분의 2가 학교와 연관됐다.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 막스 비버, 칼 야스퍼스, 케오르규 등 인류의 거목들과 학자들이 졸업했거나 교수였다. 노벨수상자가 7명이나 배출됐으니까. 통일총리 헬무트 콜도 동문이다. 그 대학이 수백 년간 이 도시의 정신적 문화적 삶의 초석이 된 거겠다. 그래서 매년 삼백만 명이 여길 찾는다는데, 오늘은 나로 인해 한 명 더 추가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도착 즉시 식당부터 갔다. 이렇게 먼 이국의 소도시에도 한국식당이 건재하니 한국인의 저돌적인 근면성에 미소가 인다. 김치찌개를 먹으니 비행기에서 날밤을 새 이완된 몸이 수혈 받은 듯 반짝한다.
대학도시답게 곳곳에 자전거거치대와 자전거학생들로 강변이 바람처럼 싱그럽고 낭만적이다. 네카강을 보니 폭이 좁은데 수심은 깊단다. 빨강벽돌다리가 아담한데 현지인들은 옛날다리(알터 브레케)로 부른단다. 정식 이름은 다리를 놓은 사람의 이름을 딴 칼테오도르 다리다. 그래서 다리위엔 칼테오도르와 여신 아테나의 동상이 있다. 다리 입구에 등대를 연상시키는 하얀 쌍둥이 탑과 아치문은 마을의 방어용이었단다. 다리와 어울려 아주 동화적이다. 마크 트웨인이 이 강에서 보트를 타고 성에 도착했을 적 감흥이 ‘허클베리핀의 모험’바탕이 됐다는 가이드 말은 좀 의외다. 미국의 미시시피강 연안쯤으로 추상했었기에...
강가 기단위에 고양이 비슷한 얼굴의 원숭이동상이 얼굴 안이 빈 채 기이하다. 사람들이 원숭이 얼굴 속에 머리를 집어넣고 사진들을 찍는데 좀 그렇다. 그렇게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설과 재미삼아겠지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나 원숭이요‘하고 격하시키는 듯해서다. 원숭이가 들고 있는 원반도, 만지면 돈이 생긴다는 지어낸 말에 얼마나 사람 손에 시달렸는지 거울로 변했다. 건립유래는 짓궂다. 다리건너 마을과 사이가 틀어진 시절, 너희들은 원숭이 엉덩이나 보라는 의도로 세웠다나. 밑의 기단 바닥에 작은 쥐 두 마리는 무슨 뜻인지, 원숭이 얼굴 속은 왜 비웠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지만 여전히 답을 모른다.
다리건너 ‘철학자의 길’은 길목에 ‘Philosophen weg’란 작은 표지판을 따라 이어진 오솔길이다. 즐겨 산책했다는 칸트, 야스퍼스, 헤겔, 괴테의 흔적이 살아 숨 쉬는 길이다. 구시가지 마르크트 광장 가는 길에 슈만이 살던 아담한 집을 봤다. 새삼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 둘의 제자였던 브람스가 스승인 클라라를 향한 짝사랑의 순애보가 엮어진 곳이다 싶으니 짠하다.
이곳 어디서든 700년 역사의 랜드 마크인 하이델베르크성이 보인다. 독일에선 드물게 구도심이 잘 보존됐다더니, 동화속의 마녀의성이 초록언덕암반위에 우뚝 서있다.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간의 30년 전쟁으로 성이 크게 훼손됐던 데다 번개로 화재까지 났단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빅톨 위고가 “이 성은 유럽을 뒤흔든 모든 사건의 피해자가 돼왔고 지금은 그 무게로 무너져 내렸다”고 탄식했을까. 프랑스군대가 점령파괴 했던 상처를 상기하고자 일부를 그대로 두었단다. 다행히 2차 대전 땐 피해를 면했어도, 성벽과 뒤쪽 건물부분이 허물어진 채인 이유다. 아닌 게 아니라 세월의 무게와 역사의 진실이 더 강하게 다가온다.
성 입구엔 성주가 부인의 생일선물로 지어줬던 아치형의 엘리자베스 문이 있다. 문엔 ‘나는 이곳에서 사랑하였고 사랑받으며 지냈노라’는 괴테의 시구가 새겨져있다. 실제로 60세이던 괴테가 30대인 마리안느와 여기서 사랑과 낭만을 노래했기 때문이다.
지하와인창고엔 130그루의 떡갈나무로 만든 세계에서 가장 큰 술통이 있단다. 전쟁발생시 식수부족을 우려, 와인으로 비축대비하려고 길이 8m, 폭 7m ,용량이 22만 리터의 술통인데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시간상 구경을 못해 미련이 남는다. 성벽에서 내려다보는 구시가지의 모습이 꿈결 같다. 화사하게 고풍스런 벽돌색지붕의 집들, 구불구불 굽어진 강줄기, 새파란 하늘, 흰 구름의 조화가 너무 예뻐 말이 안 나온다.
성 아래의 상가를 걸었다. 조그만 집인데 깃발이 날리고 황소문장의 부조가 있는 학사주점이다.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의 실제 무대였고, 괴테가 자주 들렸다는 그 주점이 6대째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것. 2대 이상 가는 상점도 식당도 드믄 한국 실정과 비교돼 놀랍다. 주변 상가들 간판이 이색적이고 파흐베어크(Fachwerk)란 독일식전통목재가옥들이 예쁘다. 나무로 뼈대를 완성하고 사이에 벽돌이나 진흙을 채우는데, 대들보들이 외벽에 지그재그 선으로 노출돼있다. 창문이 많고 지붕은 삼각형으로 뾰족한데, 눈쌓임 방지라고도 하고 마녀퇴치용이란 설도 있단다. 외관이 동화적이라 후자의 설에 무게가 실린다. 영어권에선(Timber Framing)가옥이라 칭한다.
독일 어느 시인의 송가다. “오래전부터 하이델베르크를 사랑하고 있노라/기꺼이 그대를 어머니라 부르며 끊임없이 노래를 바치고 싶노라/그대 내가 아는 한/조국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여. 그렇게 사랑받는 예쁜 도시랑 작별이다. 버스를 타고 좀 전에 머물렀던 성 밑으로 뚫은 터널을 지나니 기분이 묘하다.
첫 날 숙소는 작은 마을이다. 집이었던 걸 호텔로 개조해 로비도 없고 작은 골목에 출입구만 두 개다. 방 열쇠도 전자키나 카드키대신 정겨운 아날로그다. 반가움에 룸메이트 S와 웃음을 나누며 들어가니 깨끗하고 아늑하다. 독일에서의 첫 밤은 그렇게 사위어갔다.
<
방인숙/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