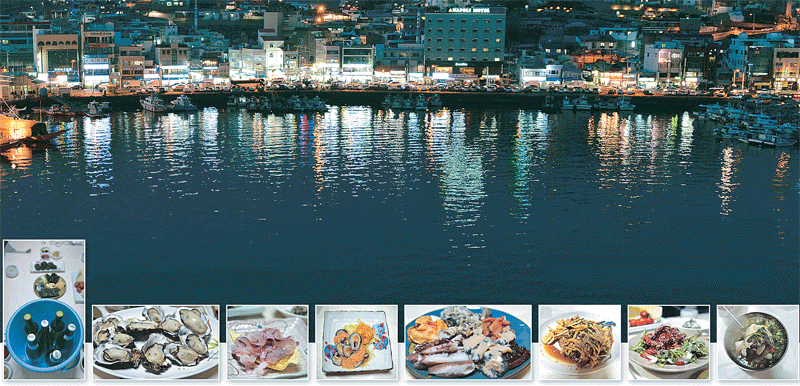▶ ■ 남녘 `주당들의 성지’ 다찌집 가보니
▶ 소주-맥주 `기본’ 시키면 굴·해삼·전복·문어 등 바다서 잡힌 안주 줄줄이
조선시대 통영은 한양으로 통하는 별로(別路)가 따로 있을 만큼 은성한 포구였다. 그만큼 술과 음식 문화도 발달돼 있다. 통영의 중심지인 강구안의 야경.
그래, 니 잘 왔다. 술꾼 성지순례 한다 캤재? 그라믄 당연히 여 다찌집부터 와 봐야재. 이리 건너온나. 같이 한 잔 묵자. 반갑데이. 자, 일단 한 잔 받그라. 내 이름? 고마 됐다. 이름은 알아 말라꼬. 그냥 토영(통영) 아재라 캐라. 이래 다찌집서 만나믄 다 아재가 되고 조카가 되는 기라. 한잔 쭉 털어 넣고 들어보이라. 내 지금부터 여 토영 다찌집이 어떤 덴지 차근차근 이얘기해 줄라카이. 맞다. 일본말 다찌노미(立飮み)에서 왔다코도 카고 도모다찌(友達)에서 왔다카기도 칸다. 우리말로 하자믄 선술집(다찌노미), 친구끼리(도모다찌) 묵는다, 뭐 그런 뜻이라 카대. 글카이께네 일제강점기 때 생긴 이름일 끼(것이)다. 글타 캐도 다찌집이 일본식 술 문화라 카는 건 절대 아니데이. 이래 술 묵는 건 원래부터 여 토영 문화라. 우리 끼데이. 알겠나? 다찌집이라 카는 기 뭐냐 카믄, 술만 시키믄 안주사 마, 주인이 주는 대로 안 묵나. 쉽게 설명하믄 그긴 기라. 뭐 줄 지는 니도 모르고 내도 모르고… 그날 주인 아지매 마음이다.
글카믄 마산 통술집이나 삼천포 실비집하고 뭐시 다르냐꼬? 바라바라, 니 잘 들으래이. 여 토영은 있다 아이가, 종이품 삼도수군통제사가 300년 동안이나 와 있던 곳이데이. 저 육품들이 있던 데캉 우째 비교하노? 식재료도 식재료지만 그 술문화, 음식문화가 같을 수가 있었겠나? 조선시대 종이품이면 지금 차관급이데이. 지금이사 ‘지가 차관이믄 차관이지’ 캐도, 그때는 촌에서 차관이면 어마어마한 벼슬인 기라. 이품이 내려오면 마, 가솔 노비 다 다리고 온다 아이가. 이품 벼슬이 한양서 먹던 까탈시럽던 입맛이 그대로 내려오는 기라. 그기 여 토영 와가꼬는 풍부한 해산물하고 만나가… 거 뭐꼬, 요새 말로 카믄 퓨전이 됐으니끼네 을매나 식문화가 풍성했겠노? 그기 지금 남아 있는 기 다찌집인 기라.
어, 안주 나왔다. 무라. 좀 묵고 또 갈캐주께.
(일동, 10분간 섭식. 이후 취기가 올라 아재의 말투가 투박해짐)굴 마싯재? 지금이 절정이라. 크재? 송아지 부랄만 안 하나. 이제 한두 주 더 지나서 나오는 건 벚굴이데이. 그건 암만 크도 몬 묵는다. 뭐 서울 사람들은 그것도 마싯다고 무 샀트만, 여 토영 사람들은 그거 거들떠도 안 본데이. 내는 서울 사람들 보믄 고마, 불상타(불쌍하다). 고등어, 거 머라카노… 맞다, 고갈비. 세상에 세상에… 냉동했다 녹카가(녹여서) 손질해 가꼬는 다시 얼라논 그걸 꾸(구워) 놓고도 마싯다고 처묵어 샀태. 아이고 참… 말해 뭐하겠노. 이래 왔으이 좋은 거 마이 묵고 올라가기라. 이거? 꼼장어 수육 아이가. 이래 안 무봤재? 싱싱한 걸 요래 살짝 데쳐 무야 꼼장어가 제맛이 난다카이. 얼랐다 녹캇다 캐가 맛이 없어져 부리끼네 서울선 시뻘겋게 양념을 처발라서 안 꾸 묵나.
카-. 술맛 좋제? 요것도 좀 무바라. 참숭어 회다. 요새가 철이제. 이래 다찌집은 지철(제철) 바다 음식을 차례로 내 오는 기라. 정해진 거 읍따. 여 중앙시장캉 서호시장서 그때그때 나는 싱싱한 재료로 최대한 지줌(제 나름) 맛을 살리서 요리해준다 아이가. 메르치 회도 함 무바라. 이것도 생선이데이. 싱싱하이 회로 무 본께 말리 묵는 거랑 또 다르제? 아이고 아이고… 아지매! 야 처묵는 꼬라지 좀 보소! 그걸 와 버리노? 젤로 귀한 긴데. 아지매가 젊은 총각 왔다고 특별히 챙기줬는 갑꾸만. 그기 고노와다라 카는 기다. 해삼 내장. 고만큼이 얼매친(얼마어치인) 줄 아나? 밥에 함 비비 무 바라. 진짜로 지긴다(죽여 준다). 옛날에 우리 토영 어른들은 해삼이 있으면 내장만 쏙 빼 묵고 살은 던져 버리뿌다 안 카나.
…근데 니 핵교 어디까지 나왔노? 대학은 나왔다꼬? 그라믄 청마라고 아나? 백석은? 그래, 알아? 용타. 요새 아들은 뻘거벗고 테레비 나오는 가시나들밖에 모른다 카드만. 그라믄 내 이 얘기도 해 줄테이께 함 들어바라.
여 토영 다찌집은 음식도 음식이지만, 우리 예술가들의 찐한 얘기가 진짜 핵심인 기라. 청마는 본래 여 토영이 고향이니끼네 놔 두고 백석이 얘기를 함 해보재이. 백석이가 평안북도 정주 사람이라 캐도 평생 여 토영을 그리워했다 안 카가. 니, 백석이가 ‘통영’이라는 제목의 시를 세 편이나 남깃다 카는 거 아나? 와겠노? 맞다! 사랑이데이. 이십대 청년 백석이의 마음을 호빡(홀딱) 빼앗은 게 토영 여잔 기라. 근데 이 여자가 머 하던 여자였겠노? 첫 번째 ‘통영’에 이래 돼 있데이. <…이 천희(千姬)의 하나를 나는 어늬 오랜 객주집의 생선 가시가 있는 마루방에서 만났다/ 저문 유월의 바닷가에선 조개도 울을 저녁 소라방등이 불그레한 마당에 김냄새 나는 비가 나렸다> 퍼뜩 안 떠오르나? 지금 니가 술처먹고 있는 이 방 풍경 아이가? 백석이가 다찌집 가시나를 사랑한 거 아이었겠나? 내는 그래 본다.
중스비 얘기도 함 해보재이. 이중스비(이중섭) 알재? 진짜 불운한 천재 아이가… 근데, 중스비가 육이오 때 부산이고 제주도고 거렁배이처럼 전전하다가 1953년도에 통영공예학원 선생 자리를 얻었는 기라. 미술 선생. 그라고 2년을 여 살았다 아이가. 식구도 먼 타향(일본)에 있고 우짜든지 밀항선이나 함 타볼라꼬 여 있었지 않았나 싶다. 근데 중스비가 말투도 여캉 다르고 얼굴도 하야이 곱상하니끼네 가시나들한테 인기가 있었다 안 카나. 하기사 내도 팔십년대 다찌집 다닌 기억을 해보자 카믄… 색동 저고리 입은 가시나들이 발을 쳐놓고 그 뒤에서 큰절을 하고 들어와서는 “한잔 묵어도 됩니까?” 카고 천사처럼 얘기해 쌓는데… 어데 요새처럼 버릇없이 “오빠야, 한잔 하이소” 이런 게 있노? 가재미도 젓가락으로 살을 살살 발라가 입에 넣어 주는데… 하이고, 그때가 진짜 좋았제… 아, 이거 이얘기가 우짜다가 이래 샜삣노?그래, 맞다 중스비. 중스비가 학교 급식이 지겨우면 ‘복자네 집’에 가서 밥을 묵었다 안 카나. 부둣가에 있는 술집인데 밥도 물 수 있는 그런 데였다 카대. 어디였겠노? 여 다찌집이지. 거 복자라는 가시나가 중스비한테 빠지갔고는 칙사 대접을 해주니끼니 맨날 굶고 비실비실 하던 중스비가 마, 포동포동 살이 안 올랐다 안 카나. 중스비 그림 중에 힘이 뻗치는 황소 그림 있재? 그기 다 여 토영서 그린 기다. 다찌집 가시나가 없었으면 아마 몬 그릿을 끼다. 아따, 내가 오늘 무신 말이 이래 많노? 자, 묵자. 도다리 쑥국 다 식겠다 고마.
(이후 한 통의 술이 더 들어옴. 김춘수, 윤이상, 박경리가 차례로 술안주가 됨)니도 맥주 안 좋아하는 가배? 그라믄 바까 달라 카께. 아지매! 여 맥주는 도로 가가고 쏘주로 주소. 서울선 참이슬, 처음처럼 묵는다 캐도 여선 이거 무라. 좋은데이. 마산서 만든 긴데 토영 사람들이 이기를 젤로 좋아라 칸다. 이래 쏘주 두 병, 맥주 네 병 담아서 한 바께쓰에 육만원이니께 첨엔 비싸 보이맨시로도 음식 나오는 거 보면 하나도 안 비싸재? 두 바께쓰째부터는 삼만원 받고. 근데 이게 원래 다찌집 방식은 아인 기라. 원래는 아지매가 묵는 거 봐 가믄서 알아서 음식을 한 점씩 차례차례 챙기 줬는데, 이기 마 외지 사람들한테 유명해지믄서 바끼삣는 기라. 얌체맨치로 알라들까지 데꼬 와서는 술 한 병 달랑 시키놓고는 계속 음식 내노라카이 이게 되나. 아지매들 마이 망했다. 그라다 보이 이래 주는 시스템으로 바낏네. 이게 세련돼 보일지 몰라도, 내는 참 아쉽다카이. 옛날 아지매 그 푸근시러븐 정이 사라지뿟는 거 같아서.
…야가 와 이라노? 니 취했나? 문디, 이래 좋은 걸 앞에 놔 놓고 더 묵도 몬하고… 야가 울라 캐샀네. 사는 게 힘드나? 그래, 개안타. 울어라.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된다. 여는 예인들의 땅, 토영 아이가. 자, 오늘은 이만 묵고 일어서자. 그래 잘 가거래이. 살다가 힘에 부치믄 언제고 또 내려 온나. 내려 와가 토영 다찌집에서 이 아재를 찾아라. 내 그때도 여 있을 끼다.
<유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