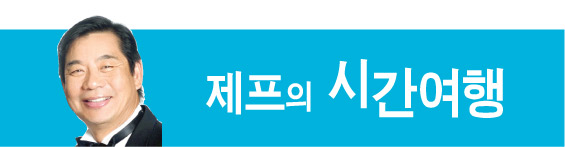아버님이 일본 출장에서 구입해 오셨던 산요 레코드 플레이어(Sanyo Record Player). 이 전축으로 수많은 팝송들을 들었다. 윗부분이 스피커다.
앞으로 할 이야기들은 실화이며, 또한 사랑의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남녀 간의 그런 달캉달캉한 이야기는 기대 안하시기 바란다. 이 이야기들은 남자이기에 언제, 어디선가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그래서 이제야 남자라고 혼자서 묵묵히 걸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다른 남자들에게 바치는 사랑의 오마주(Homage)다.
------------------------------------------------------------------------------
# 쉼표도 마침표도 없는 시간
시간에는 쉼표도 마침표도 없다. 인간이 부여한 시간의 의미란 기억하고 싶은 사건에 날짜와 시간을 각인하는 정도다. 그러나 시간이란 무한의 마법사는 인간의 유한적 몸부림에 홀로 끝없이 흘러간다.
시간과 함께 하면서도 다른 의미로 존재하는 것이 공간이다. 시간과 달리 공간은 인간이 지배 가능한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인간은 끝없이 짓고 허물고 또다시 건축한다. 한국인들의 끝없는 부동산에 대한 열정도 공간에 대한 지배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계탑은 무한의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유한적인 건축물로 존재한다.
얼마 전 리치몬드 캐리타운(Richmond Carytown)의 옛 정감 물씬 나는 레코드점에서 LP판 하나를 구입하던 중 흘러간 추억이 떠올랐다. 나는 서울역 시계탑 앞을 수없이 지나쳤지만 단 한 번도 시간을 확인한 기억은 없다. 손목시계가 보편화되기 이전의 상징물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들의 삶도 변했다. 70년대 서울의 젊은 학생들이 갈만한 장소는 별로 없었다. 고작 종로 2가에 있던 필하모니 음악 감상실에서 고상한 척 해보거나 ‘세시봉’이나 ‘르네상스’ 등을 기웃거리며 여학생들에게 잘난 척 했었다.
조금 여유가 있으면 조선호텔 커피숍에서 커피 한잔 시켜보았지만 아직 ‘맥스웰 하우스’나 ‘맥심’ 인스턴트커피를 최고로 여기던 시절이라 진가도 모르면서 고가에 마시던 커피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 일본에서 사오신 레코드 카세트 플레이어
1970년 초반에 아버지가 사업차 일본을 방문하고 사 오신 물건이 007 가방을 닮은 접개식 산요(Sanyo) 전축이었다. 그 간단하면서 맛깔나 보이는 전축은 라디오에 카세트테이프도 있었다.
나는 미군으로 한국에 배치되자 용산 PX에서 수시로 record(전축 판)를 사다 노래를 들었다. 당시 미군 PX에서는 레코드판을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 그중 많은 레코드판이 아직도 우리 집에 있다.
종로 어느 유명 레코드점에서 어머니 ‘빽’을 통해 ‘원판’ 좀 구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마지못해 만나본 30대 후반의 젊은 레코드점 주인은 상점 뒷방에서 국산 판 LP와 미제 원판을 견주어 보여주며 말했다.
“선생님, 보세요. 국산은 판이 뛰죠, 소음이 많죠. 클래식 하는 친구들에겐 한 음 한 음이 생명입니다. 이런 국산 판 들으면서 피땀 나게 연습합니다. 앞으로 Korea 이름 달고 국제 콩쿠르 나갈 친구들입니다. 국가 위상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절대로 장사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국가 위상 문제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 엄청난 장사꾼이었다. 장담하건데 그는 성공했을 것이다. 마지못해 필요한 판들 이름을 종이에 적어보라고 했다. 애국하겠다는데 어떡하겠는가?
# 클래식의 양대 산맥
그렇게 그가 원하는 판들을 사다 팔았다. 그중 금빛 문장의 ‘도이치 그라마 폰(Deutsche Grammophon)’ 그것도 카리스마 날리는 허버트 카라얀(Herbert-von-Karajan)의 원판이 인기가 좋았다. 없어서 못 팔았다.
워낙 그의 이름이 신성화 되어 있어 그가 누군지 궁금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얼마 후 독일 파병 당시 시간을 내서 베를린 필하모닉 공연을 직접 관람했다. 카라얀은 무려 34년간, 죽기 전까지 베를린 필하모닉을 이끌며 그의 지휘봉을 놓지 않았다.
당시 클래식의 양대 산맥은 세계 문화의 메카였던 뉴욕 필하모닉의 레오나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과 독일의 카라얀이 양분하고 있었다. 두 아이콘(Icons)의 공연을 목격한 사람으로서의 촌평이라면 카라얀은 마치 프로이센 제국 장교와도 같은 절제된, 그러면서도 완벽한 영웅(hero)의 화려함을 보여줌으로써 청중을 장악하고 휘둘렀다. 그에게는 범할 수 없는 아우라가 따로 존재했다.
반면 유대계 미국인이었던 번스타인은 훌륭한 미국 예술인들이 그러하듯 자유와 선택,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해방감과 감동을 선사했다.
# 원판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여학생
어느 날, 그 주인에게 클래식 판들을 전달하고 나오려는데 긴 머리의 여학생이 팝송 섹션에서 국산 팝송 판들을 뒤적이고 있었다. 내가 지나가는 말로 누구 음악을 좋아하냐고 물었더니 “James Taylor”하며 제법 똑발라지게 대답했다.
내 눈이 내 왼손에 들고 있던 팝송 판들로 향했다. 그 판들은 내가 집에서 산요(Sanyo) 전축으로 들으려고 산 게임용품이었다. “이 James Taylor?” 하며 8군 PX에서 오전에 샀던 판을 보여주니 두 눈이 화들짝 놀란다. 국산 제작 팝송 레코드들은 여러 가수 노래들을 모아 만든 짬뽕이었지 미국식으로 한 가수를 단독 제작한 판들이 없었다.
그 자리에서 포장지를 뜯어낸 후 만년필로 내 이름과 날짜를 서명하고 그녀에게 건넸다. “오늘 선물!” 예상치 않은 선물을 초면의 남자에게서 받아든 그녀는 잠시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레코드점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내가 판 원판(Original LP Record)들을 들으며 클래식에 심취하고 연습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
#어느 날 사라진 레코드점들
1980년대 중반 DC 다운타운에 엄청난 크기의 타워 레코드(Tower Record)점이 있었다. 나는 가끔 들러 물건을 고르곤 했는데 그날은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세고비아(Andres Segovia)’ 공연을 케네디 센터에서 관람하고 그의 판을 하나 구입하고자 들렀다.
그런데 그때 받은 충격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넓은 매장을 가득 메웠던 레코드판들이 모두 사라지고 작은 CD들로 교체된 것이었다. 어이가 없어 판매원에게 기존의 레코드와 전축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어깨를 으쓱하며 “없애버려요(Get rid of them)” 하며 아주 싸늘하고 섭섭하게 대답했다.
그로부터 40여년이 흐른 후 여기저기에서 다시 옛 LP를 파는 상점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며 추억에 젖어들곤 한다. 서울역이나 시청 건물에 설치되었던 시계탑들은 이제 상징성 이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CD의 갑작스러운 출시와 뒤이은 판도라(Pandora) 그리고 스파디파이(Spotify)의 등장으로 이제는 골동품 취급당하는 아날로그 시스템의 LP 레코드들. 과연 우리는 시대에 맞추며 잘 살아가는 것일까? 아니면 내 체질에 걸맞는 아날로그 범주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당신의 시간표에는 과연 쉼표와 마침표가 있는가.
<다음에 계속>
Jeff Ahn
jahn8118@gmail.com
<
Jeff 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