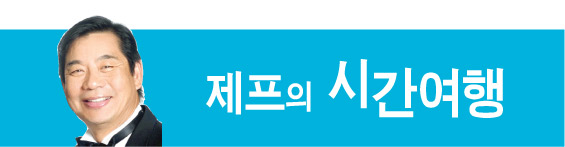▶ 쌍마(Levi’s Jean) 청바지와 카투사 일병

Camp Hovey 기갑부대.

Levi’s Jean Jacket, 엄청 입기 편하고 따뜻했다.
앞으로 할 이야기들은 실화이며, 또한 사랑의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남녀 간의 그런 달캉달캉한 이야기는 기대 안하시기 바란다. 이 이야기들은 남자이기에 언제, 어디선가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그래서 이제야 남자라고 혼자서 묵묵히 걸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다다른 남자들에게 바치는 사랑의 오마주(Homage)다.
---------------------------------------------------------------------------
# 미제 물건과 카투사
70년대 미군으로 한국에서 근무할 무렵 PX에서 미제 물건 좀 사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다. 대부분 거절했지만 참 거절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다. 당시 미군 봉급보다 ‘양키’ 물건 장사해서 돈 번 사람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한국정부와 미군 당국 모두 점차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던 시기였다.
우리 중대에서 근무하던 카투사(KATUSA)들은 대부분 괜찮은 친구들이었다. 그들 중 딱 한 친구에게 선물할 기회가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겠다. 그들은 한국군과 달리 영양가 있는 미군 식사에 더운 여름에 에어컨 팡팡 나오고 추운 겨울엔 히팅 펑펑 터지는 미군 막사에서 먹고 자고 미군들과 같이 근무하며 영어 배우는 것을 크나큰 혜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부분 도시 출신들이었던 그들은 교육 수준이 일반 한국군보다 높았다. 그들이 카투사를 가장 선호했던 이유는 기압과 구타가 정규 한국군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 “야 너, 누구 빽이야?”
낙엽 떨어져 서늘한 초겨울날 우리 중대에 ‘카투사 일병’이 배치됐다. 작은 키에 동그란 얼굴 그리고 싹싹한 행동으로 ‘형님’ 하며 사람들에게 밉상으로 보일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것이 처신만 잘한다고 잘 풀리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저녁에 자신이 강원도 시골 출신이고 학벌이 없는 점을 고백하자 ‘최 병장’이라는 친구가 “야 임마, 너 그럼 누구 빽이야?”하고 다그쳤다. 일병이 기가 죽어 눈치 보자 “짐 풀어봐”하며 몰아세웠다. 일병이 풀어 제친 작은 보따리에는 그야말로 시골, 산골에서나 찾을 수 있는 허접한 먹을거리 몇 점뿐이었다.
성질이 고약했던 ‘최 병장’이 소리쳤다. “야, 너 어디 가서 카투사라 하지 마. 너 짝퉁이야 임마.” 그는 후배들을 잔인하게 괴롭혔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그 자리가 민망해서 밖으로 나갔다. 뒤로 들리는 카투사 고참들의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참 싫었다.
# 달빛 아래에서의 구타
산 중턱 중대 막사 앞 작은 개울에 살얼음이 낄 무렵, 깊은 밤 신음소리에 잠을 깼다. 눈을 떠 일어나니 나만 깬 것이 아니었다. 미군 동료들이 막사 창가에서 아무 말 없이 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유령 같아 섬뜩했다.
나도 창가로 갔다. 희미한 달빛 아래 카투사 여러 명이 바닥에 엎드려 있고 몇 명의 고참이 손에 ‘빠다’를 들고 그들을 패고 있었다. 유심히 보니 모양새는 집단 기합이었지만 미운 털 박힌 ‘강원도 일병’을 교육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것들이 요즘 기합이 빠져 가지고, 오늘 죽을 줄 알아” 하는 ‘최 병장’의 독기 오른 소리가 들렸다. 그는 인간미 없는 인간의 전형이었다. 몇 대를 때린 후 물통에 가득 담긴 얼음물을 그 일병 몸에 뿌렸다. 차디찬 냉기가 막사 안에 서있는 내 몸에 전달됐다. 미군 동료들은 그들답게 보고도 못 본 척, 목석 마냥 상황을 관망했다. 기합은 있어도 구타가 없는 미군세계에서 한국군의 군 문화는 흥미로운 광경이었을 것이다.
사람 하나 잡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한가득 담긴 얼음 물통을 군화로 걷어찼다. ‘최 병장’이 “서전(Sergeant) 안, 이건 한국군 문제야, 넌 끼지 마!” 하며 눈을 부라렸다. 그 정도에 물러설 내가 아니었다.
“카투사는 미군 소속이야. 내일 근무 못하면 책임질 거야? 중대장에게 보고할까? 카투사 떠나고 싶어?”
그 어느 말보다 ‘카투사 떠나고 싶어’ 그 말이 즉효였다. 사실 말썽부려 카투사에서 한국군으로 재배치된 녀석들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 한국군에게 완전 찬밥에 도토리 신세였다. 살얼음판에 고개를 처박고 신음하는 그 녀석을 내 손으로 일으켜 세우지는 안았다. 그러나 그날 군기 잡기는 그렇게 끝났다.
# 크리스마스 선물
얼마 후 ‘강원도 일병’이 첫 휴가를 얻어 고향집에 간다고 했다. 그는 그 사건이 있은 후 나만 보면 ‘형님’ 소리를 달고 살았다. 주말에 동두천 2사단 PX에서 어머니 크리스마스 선물을 고르고 있는데 당시 인기 좋았던 ‘쌍마(Levis)’ 양털 재킷이 눈에 뛰었다. 청바지 천에 안감을 양털로 마무리한 재킷이 보기 좋아 하나 구입했다.
중대로 돌아오니 그 재킷 입은 내 모습이 보기 좋았는지 ‘강원도 일병’이 부러운 듯 나를 쳐다보았다. “왜? 마음에 들어?” “서전 안은 뭘 입어도 멋있어요.” 하며 머리를 꾸벅했다. 그 순간 그 재킷을 벗어서 ‘강원도 일병’에게 건넸다. “집에 간다며…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나의 젊은 호기에 그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억지로 입어보라고 해서 걸쳐 입은 그는 “시골 놈이 이런 옷 입어도 되나요?”하며 쑥스러워 했다.
# 시계탑 성탄 데코레이션과 탱크부대
서울에서 어머니와 따스한 성탄을 보내고 다시 부대로 복귀하는 8군 버스에 올라타니 정말 복귀하기가 싫었다. 서리 자욱한 버스 유리창 너머로 추운 겨울날 서울 거리는 눈과 얼음과 연탄재로 뒤범벅이었다. 그 거리를 하이힐 ‘금강’ 구두 신은 오피스 처녀들이 종종 발걸음으로 일터로 달려가는 모습에 우리도 언제인가 잘 살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걸었다.
사단 본부가 있는 동두천에 도착하니 높은 시계탑에 성탄 데코레이션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 옆에 배열되어 있던 수많은 A-1 탱크들과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 울며 건네주는 양미리 무침
다음날 근무 준비를 하는데 ‘강원도 일병’이 나를 찾아와서는 작은 밥그릇을 건네며 ‘겅거니’(반찬)로 먹으라는 거였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양미리였지 싶다. 아마도 부모가 기차 칸에서 아들 먹으라고 싸주신 음식을 나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입고 있는 군복이 너무 추워 보여 내가 선물한 양털 재킷을 물어보자 머뭇거리면서 눈시울이 젖어 든 그는 시골 아버지에게 선물했다는 것이었다.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날 저녁 카투사들의 모임에서 휴가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강원도 일병’은 또다시 고참들에게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했다.
# 자신을 감추었던 ‘최 병장’
다음해 입춘을 앞둔 어느 봄날, 그렇게도 모질고 악바리 같던 최 병장이 제대했다. 중대 본부를 떠나는 그의 마지막 뒷모습을 바라보던 카투사 상병이 내가 들으라는 듯 말했다.
“참 이상하죠. 지도 강원도 촌놈이면서 왜 강원도 사람이라면 치를 떨며 미워했을까?”
그때까지 나는 그가 강원도 출신인지도 몰랐었다. 그 말이 너무나 시사하는 바 컸다. 한때 우리는 우리 것에 미친 듯 심취되어 살기도 했지만 모든 우리 것이 촌스럽고 열악하다며 기피하던 때도 있었다.
우린 때로는 ‘강원도 일병’이기도 했고 때로는 ‘최 병장’이기도 했다 그것이 우리의 자화상이었다. 내가 미군 PX에서 사서 딱 한번 입어 보았던 ‘쌍마(Levi’s)’ 양털 재킷, 어느 누가 입고 추운 겨울날들을 지냈을까?
<다음에 계속>
(jahn8118@gmail.com)
<
Jeff 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