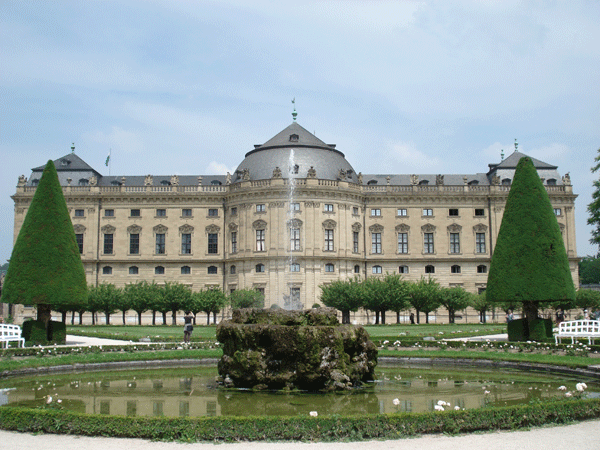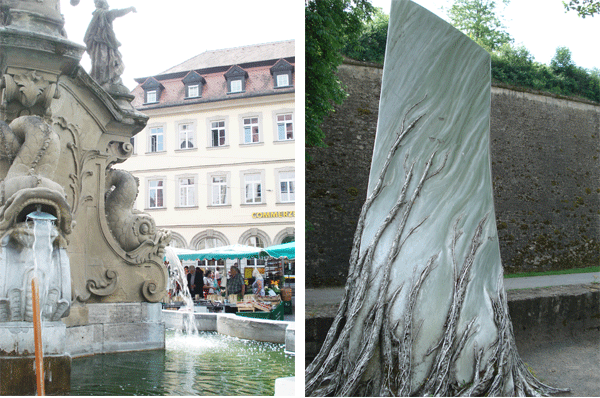▶ 수필가 방인숙의 동유럽 여행기 ⑪ 뷔르츠부르크(Wuerzburg)

성안의 화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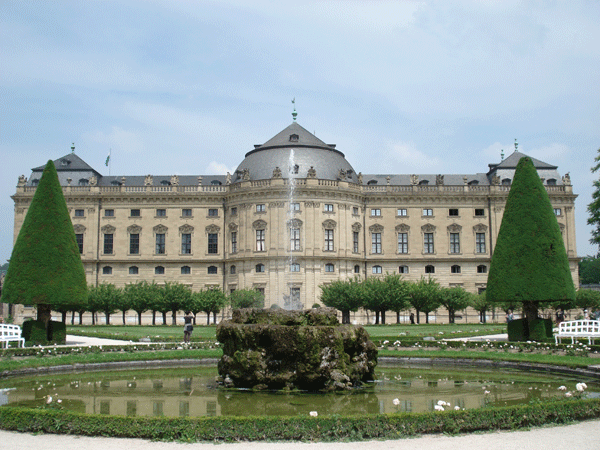
레지던츠 정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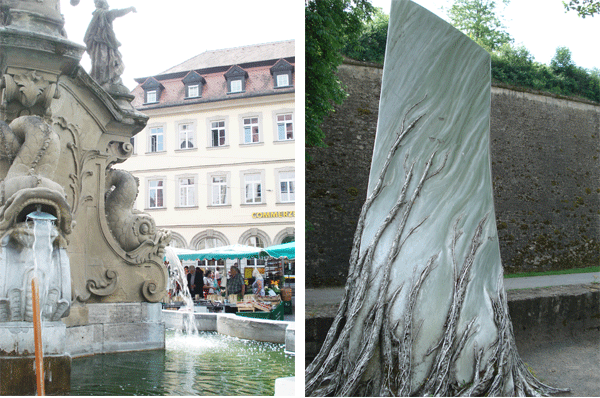
분수가에 노점들(사진 왼쪽)과 은 통나무
노벨수상자 6명 배출한 유서깊은 막시밀리안대학 유명…작은 프라하라고 불려
600년 역사 알테마인 다리는 마리엔 베르크 요새기슭 걸쳐있는
고풍스런 보행자 전용 석교
13세기 건축된 마리엔 베르크 요새 성벽은 남한산성 떠올려
주교 권세 염증난 시민들 항거 의미로 세운 은나무 통뿌리 이채로워
노이민스터 성당 뒷길 독일 바로크 건축물 대표작 레지던츠 주교 궁전위치
독일엔 지명 끝에 Burg나 Berg가 붙은 도시가 많다. Burg는 성, Berg는 산이라니까, 독일남중부 작은 도시인 뷔르츠부르크는 ‘풀잎 성’이란 뜻이겠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를 유람하고 원점 독일로 왔다. 독일 도착 첫 밤에 묵었던 숙소기에 새벽산책코스를 지난번과 반대편인 미답지로 잡았다. 아기자기한 골목과 집들을 벗어나니 곧바로 기차역이다. 역사의 육교가 운 좋게 공원과 연계돼있다. 발길이 스르르 그쪽으로 갔다. 미적 감각이 우수한 정원사의 손길아래 공들여진 티가 났다. 꽃 종류의 안배도 그렇거니와 색깔의 조화 역시 감탄 급이다. 이른 아침인데도 여기 저기 분수에서 물줄기들이 솟는다. 조각상들도 다양해 공원의 장구한 역사가 느껴진다. 독일 공원의 정수(精秀)다.
열심히 사진을 찍어대는 나를 보고, 어떤 남자가 바쁜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손짓하며 뭐라 한다. 열의를 다해 공원의 소개와 안내를 설명하는 눈치인건 짐작되는데, 도시 무슨 소리인지 알 턱이 없다. 단 한마디도.
오래 전 베스트셀러였던 죤 그리샴의 ‘The Firm’(한국번역 책제목 ‘그래서 그들은 바다로 갔다’)에 이런 말이 나온다. 주인공이 형한테 감옥에서 독어를 어찌 그리 빨리 마스터했냐고 묻자 “쉽다고. 원래 독일어와 영어는 사촌지간쯤 된다. 영어의 50%정도가 고대영어를 통해 독일어에서 왔다”고 말한다. 사실 요번 여행에 독어설명서를 눈여겨보니 그 말이 약간은 이해가 간다. 정원인 Garden은 Garten이고 광장인 Plaza는 Platz인 게 어렴풋 짐작되니까. 그래서 눈감고 코끼리 다리 더듬듯 문맥의 윤곽만이라도 추측하는데, 완연히 다른 발음인 회화로 나오면 캄캄 절벽이다. 고로 가슴 따뜻한 사람의 친절은 무산됐지만, 상세한 정보는 놓쳤지만, 독일공원구경 자체가 보너스라 흐뭇하다.
부지런히 숙소로 와 조식 후, 라인 강을 낀 바이에른 주의 적고 예쁜 도시라는 뷔르츠부르크행이다. 10세기에 이루어진 이 도시는 프랑크푸르트와 뉘른베르크 사이 마인 강 유역에 자리한다. 독일 로맨틱 가도의 첫 관문이고 대학도시로도 유명하다. 독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막시밀리안대학이 6명의 노벨수상자를 배출했으니까. 체내이상을 발견하는 X선인 뢴트겐선(Roentgen Rays)을 발명한 물리학자 렌트켄(Rontgen)도 이 대학의 교수였다.
Mine강이 폭은 그리 안 커보여도 운하로 배가 다닐 만치 깊다. 마인강의 제일 역사 깊은 다리가 ‘옛 마인다리’라는 뜻의 알테마인(Altemain Brucke)이다. 600년이나 됐다니까. 마인강 건너편 마리엔 베르크 요새기슭에 걸쳐있는, 고풍스런 보행자전용석교다. 1133년에 처음 놓았던 다리가 붕괴 되자, 1488년에 복구됐다. 양편으로 12개씩 왕이나 주교의 사암상이 있다. 1720년대에 6개, 1730년대에 6개씩 세웠는데 전쟁으로 파괴된 걸 복원했다. 그래서 프라하의 카를교에 빗대 이 도시를 작은 프라하라고도 한단다.
대부분의 유럽도시들은 꼭 강을 끼고 있고, 대부분 그 강을 기준해 구시가와 신시가로 구분한다. 마인 강을 끼고 있는 이 도시의 역사는 8세기부터지만 기원천년 전부터 켈트족이 살았던 곳이다. 구시가지 신시가지로 명확히 가를 정도로 도시가 크진 않다. 그래도 기찻길을 따라 구획된 쇼핑가와 마르크트 광장(Markt Platz)정도를 구시가로 본다.
버스에서 내리니, 꼭 성벽이 있는 서울 어느 외곽의 어디쯤이다. 성곽의 아치형입구로 들어가는 찰나 남한산성이 떠올려졌다. 이 도시의 소개용 책자나 사진에 알테마인 다리와 함께 꼭 쌍으로 등장하는 마리엔 베르크(Marien Berg)요새다. 13세기에 건축됐던 이 요새는 마인강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켈트족의 성채가 있던 역사적 장소다. 요새 안에 무기고, 병영, 와인저장소, 창고가 있다. 중간에 첨성대 같이 우뚝 서있는 둥그런 탑은 곡식저장소고, 왼편 푸른색 돔의 우아한 건물이 성당이다. 706년에 건립된 이 마리엔 예배당을 둘러싸듯 축성했던 게 이 요새의 시초다. 현재의 건물 대부분은, 17세기 주교에 의해 르네상스양식 성곽으로 개축했던 주교의 거성이다.
‘은 나무 통뿌리’라고 은으로 만든 나무둥치가 덩그러니 있어 이채롭다. 당시 너무나 막강한 주교의 권세에 염증을 낸 시민들이 항거의 의미로 세웠단다. 그런데 은이라 번쩍번쩍 화려해 보여선지 품고 있는 고귀하고 값진 뜻과는 이미지가 겉돈다. 나만의 느낌일까? 하여간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듯 권력 또한 권무십년성(權無十年成)아닐까만. 그저 예나 지금이나, 어디서든, 늘 권력욕과 집착 때문에 문제발생이다.
성곽 아래서 조망하니 마인강이 운하라 강둑에 갑문시설인 격벽이 보인다. 초록구릉과 강, 다리, 주황색지붕의 집들은, 역시 숨을 앗는 절경이다. 저 넓은 초록 포도밭은 꼭 우리의 시골 과수원풍경이다. 정겨워서 그리움 속에 한참 응시했다. 바로 저기서 수확한 포도들이 화이트와인으로는 세계서 최고로 맛있다는 후랑킨(Franken)와인으로 변하는 거겠다. 이 시의 소중한 초록들녘인 셈이다.
수백 년 동안 영주 주교들이 강력한 권세를 휘둘렀던, 여기서 최초의 성당인 노이민스터(Neumunster)교회로 갔다. 입구에선 작아보였는데 안에서 보니 웅대한 규모다. 높디높은 천장의 장식, 조각상 등 대단하다. 그다음 첨탑이 아름다운 대성당 성 킬리안(Dom St Killian)은 뷔르츠부르크에서 순교한 선교사 성 킬리안의 무덤위에 세워졌다. 일반 성당은 그냥 뮌스터(Munster)라 하지만, 주교가 직접 관할하는 성당은 돔(Dom)이라 한단다. 독일에서 네 번째로 큰 로마기독교 교회라 수백 년간 모여진 유물과 유적을 소장하고 있다.
그 성당 뒷길에 1744년에 완성된 레지던츠인 주교의 궁전이 있다. 마리엔 베르크요새에 살던 제후주교가 시내로 거처를 옮기느라 지은 거다. 남독일의 바로크 건축물 가운데 대표작이자 이 도시의 대표명소다.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고 주교거주지라고 감탄했단다. 아치형의 천장에 있는 유럽에서 제일로 크고 세계최대 크기인 프레스코화가 유명하다. ㄷ자형의 궁전엔 방이 300개고, 호화로움의 극치인 ‘황제의 방’은 금을 듬뿍 사용한 황금장식가구들이 즐비하단다. 황제의 방에서 매년 6월에 모차르트음악회가 열린단다.
2차 대전 후 영국이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는 다 파괴하기로 했었기에, 이 궁전도 완전 피폭됐다. 불과 20분 만에 90%가 파괴됐는데, 복원엔 자그마치 25년이나 걸렸단다. ‘거울의 방’은 가구와 샹들리에만 겨우 옮겼단다. 한 조각만 남아있는 거울을 9년 걸려 복원했단다. 그런 방식으로 1980년에야 완전복구가 끝나, 198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가장 통일성 있고 독특하게 보기 드물 만큼 원형대로 복구해서란다. 빈의 쇤부른 궁전, 파리 베르사이유 궁전과 함께 유럽 후기 바로크시대의 궁전 건축 상 아주 중요 궁전이다.
궁 뒤편의 호프정원(Hof Garten)은 프랑스풍에서 영국식까지 본 따 만들었다. 동쪽 정원은 궁전의 중심축을 확장한 듯 조성한 화단의 울타리가 계단형의 테라스고, 정원 끝엔 온실도 있다. 남쪽 정원엔 주목나무로 삼각뿔 8개를 대칭되게 만들고 중심에 큰 원형분수가 물을 뿜는다. 정원 광장에 있는 프랑코니아(Fran Konia)란 분수도 범상치 않다. 기단이 3단짜리인데 3단과 2단의 조각상들이 꼭 동자가 오줌을 누는 듯 물이 나와서 재밌다.
이 도시도 역시 아스팔트는 없고 돌길이라 발바닥은 아파도 운치를 살린다. 헤르만 헷세가 이 거리를 거닐면서 “다시 태어나면 여기서 태어나고 싶다”고 했다는 말에 절대 공감이다.
알테 마인교로 건너가기 전에 중앙에 두 첨탑이 있는 성 유테판 교회다. 왼편의 붉은색 건물이 구시청사고 그 앞 광장에 랜드 마크인 “네 개의 파이프분수‘란 탑이 특색 있다.
5월말인데도 진땀나게 더운 한증막이다. 마을을 유람하다 S덕에 애들처럼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들고 집합장소로 가는 길가다. 분수를 끼고 뺑 돌아 가설된 야외시장이 눈을 끈다. 매점의 과일들 속에서 유독 딸기가 눈에 든다. 꼭 옛날 안양원조딸기마냥 앙증맞고 새빨갛고 탱글탱글해 보인다. 오늘이 여행의 마지막 밤이니 딸기파티를 하자며 푸짐하게들 샀다.
점심으로 마침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가 나왔다. 내가 좋아하는 와이트 클램 소스나 크림소스가 아니라 좀은 실망스러웠는데, 토매도 파스타소스가 완전 별미다. 여행 중 제일 맛있는 식사였기에 기억나는 식당 이름이 폰타나였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처음이자 마지막 방문도시인 프랑크푸르트로 향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