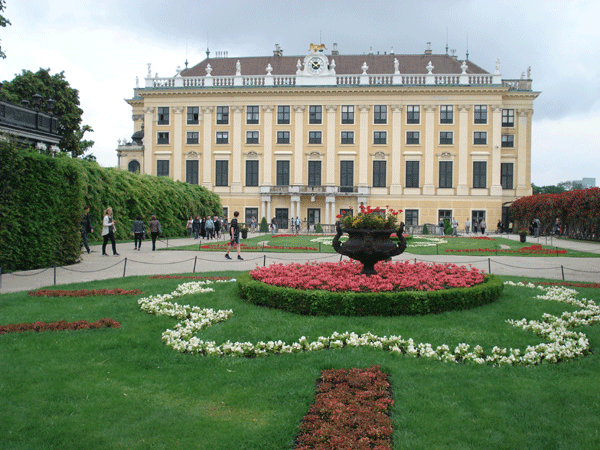▶ 수필가 방인숙의 동유럽 여행기 ⑥ 비엔나(Vienna)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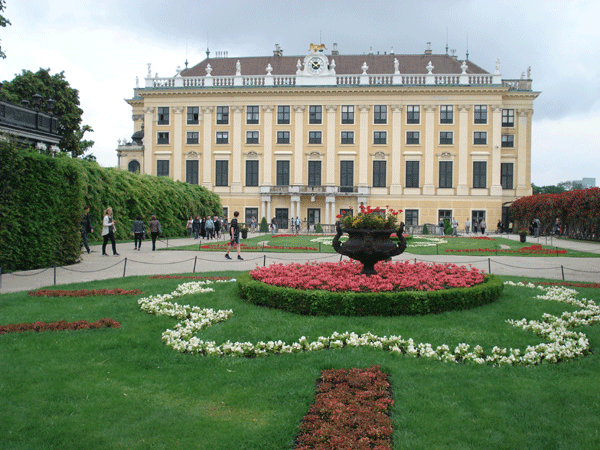
벨베데레 궁전 전경

명사들의 와인

슈테판 성당
수년 연속 살기 좋은 도시 1위…안전도 문제는 세계 톱 10
1137년 세워진 바흐 헨겔 식당은 호이리게 식당의 원조
그해 수확한 포도로 담근 햇 포도주있으면 월계수 램프 불 밝혀
아코디언.바이올린 생음악 합주로 아리랑.소양강 처녀 등 연주
300년 역사 팔레 아우어 슈페르크 극장서 즐기는 클래식 음악회 감동
독일 이름으로 빈(Wien)은 유럽인들이 최고로 꼽는 도시다. 수년 연속 살기 좋은 도시 1위고 안전도문제는 세계 톱 10에 든다. 그런 비엔나를 영화 ‘The Sun Rise’를 보면서 방문의 열망을 더 키웠다. 그런데 드디어 왔으니, 바야흐로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다.
버스와 택시노선이 도로 가운데라 이질적이다. 바닥레일은 없지만 공중그물 같은 전기선을 붙잡으며 가는 2량짜리 전기버스가 전차이미지라 반갑다. 재밌는 사실은 반려동물교통비를 낸다나. 유모차자리가 따로 마련돼 있다는 건 바람직하다. 건물들은 하나같이 고풍스러워 고대도시의 느낌이다. 도시가 말발굽 형으로 안은 고급주택지고 외곽엔 중산층이 산단다.
저녁을 먹으러 빈 외곽 숲속의 그린징 마을로 갔다. 1137년에 세워진 바흐 헨겔(Bach & Hengl)식당이다. 자체 포도원에서 그 해의 포도로 담근 햇와인만 판다는 호이리게 식당의 원조다. 호이리게(Heurige)어원은 호이리크(올해)에서 비롯됐다. 문에다 월계수나 솔가지를 걸어놓고, 호이리게가 있으면 램프에 불을 켜놓고 없으면 꺼놓는다. 담쟁이덩굴에다 처마도 낮고 소박하지만, 몇 세기를 거스른 느낌이 올 만치 역사가 깊고 아늑해 보인다. 그러니 베토벤과 슈베르트의 단골식당이었겠지. 안에는 방문객들 사진을 쭉 걸었는데 세계의 명사들 총집합상태다. 대충만 일별해도 사마란치, 부시, 클린턴, 시진핑, 푸틴, 달라이라마, 마돈나, 알랑 드롱, 쏘피아 로렌에다 베네딕트 16세 교황님까지 계실정도다.
나온 음식이 삶은 소시지를 앞뒤로 가늘게 가른 꽃 소시지에다 돼지고기도 훈제한 수육이라 전혀 느끼함이 없다. 햇와인은 달고 넘기기 참 순하다. 전통의 하나인지 아코디언과 바이올린의 생음악합주는 특히나 의외다. 거기다 아리랑부터 시작해 소양강 처녀, 만남, 사랑의 미로, 과수원 길 등 다 한국노래다. 한국관광단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짐작되는 부분이다. 어이됐건 오랜만에 만리타향에서 고국의 대중가요를 생음악으로 들으니 감개무량이다. 그것도 테이블마다 팁 정도만 지불하고 말이다.
호텔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음악회로 갔다. 여행 중 처음 밤 외출이라 살포시 들뜬다. 빈에서 가장 오래된, 300년 역사를 간직한 팔레 아우어 슈페르크(Pala’s Auer Sperg)극장이다. 옛날 황제나 귀족들을 위한 콘서트홀이었다. 삼사백석 규모라 크진 않아도 바로크양식의 고풍서린 석조건물이다. 보통크기의 국기가 걸려있으니 역사적으로 꽤나 가치 있는 장소란 의미겠다. 과연 로비엔 빨강카펫이 깔렸고 높다란 천장엔 대형 프레스코화가 눈을 끈다.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우아하게 레드카펫을 밟고 계단을 올라가니, 가운데 사자조각상이 있고 양쪽으로 레드카펫의 연속이다.
공연장엔 대형 크리스틀 샹들리에들이 화려한 프레스코천장 아래서 불을 밝히고 있다. 계단 3개 높이의 자그마한 무대와 빨강쿠션이 깔린 나무의자도 옛날 그대로란다. 자연히 중세시대의 극장에 온 느낌에 사로잡힌다. 관객들이 거의 노부부들 아니면 우리 같은 관광객들이다. 은퇴 후 부부가 이런 음악회데이트를 즐기는 삶은 참 고아하겠구나 싶어 살짝 부럽다. 공연장은 마이크 없는 대신 타원형의 실내가 특수방음장치로 완벽하단다.
피아니스트까지 합쳐 8명의 연주자들이, 모차르트를 사랑하는 나라답게 그의 곡으로 시작한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현악 세레나데 1번 2악장이다. 이어 성악가 남자와 여자가 나와 오페라의 아리아를 들려준다. 다음엔 애달픈 사랑의 선율인 피아노협주곡 21번 2악장이다. 스웨덴 영화 ‘엘비라 메디간’의 주제곡으로 하도 유명해 일명 엘비라 메디간(Lvira Madigan)곡이라 불린다. 나는 책만 봤는데도 가슴이 무척 아픈 애절한 스토리다. 온몸의 솜털이 다 일어서듯 전율이 일어 절친인 Y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다음 클라리넷 부는 여자가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인 (K622) A-2악장을 분다. 영화 ‘Out of Africa’에 흐르던 슬프고 비감한 곡이라 가슴이 아려온다. 슈베르트가 “천사가 노래하고 있는 듯하다”고 칭송했던 40번 G단조(K550)다. 그리고 교향곡 41번 등, 음악인 아니더라도, 제목은 몰라도, 방송이나 영화, 드라마를 통해 귀에 친숙한 곡들이다. 휴식시간, 홀에서 주스, 샴페인, 와인을 원하는 대로 한잔씩 준다. 단 공연장엔 못 갖고 들어가 우린 서서 주스한잔 씩 마셨다.
2부는 오스트리아국민들이 비공식적인 제2의 국가로 여기는 애국적 국민가요다. 바로 요한스트라우스 2세의 ‘The Blue Danube’로 원어론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다. 스트라우스는 약 500곡에 이르는 왈츠, 폴카, 행진곡을 남겼는데, 이 곡이 가장 대표곡이다. 오스트리아인들이 너무나 사랑해 공항에서도 나온다. 또한 우리의 ‘제야의 종’마냥, 빈 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송년 자정의 신년음악회 때마다 연주하는 곡이기도 하다. 브람스를 만나게 된 요한 스트라우스의 부인이 부채에다 그의 사인을 부탁했단다. 브람스는 이 악보의 몇 마디를 그리고는 ‘불행히도 브람스의 작품이 아님’이라고 적었다는 일화도 있다.
왈츠는 본래 18세기중엽 오스트리아 및 바이에른지방 지방에서 유래한 민속춤곡이다. 우리에겐 온 국민이 사랑과 자긍심을 갖는 격조 높은 음악이 뭘까? 아리랑? 고향의 봄? 얼른 답이 안 나오고 어쩐지 좀 약한 느낌도 든다. 우리도 민속음악을 하나 선곡 발전시켜 범국민적으로 사랑하고 애청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다음 곡은 루마니아 작곡가 이오시프 이바노비치의 다뉴브의 잔물결(The Waves Of The Danube)이다. 우리에겐 성악가 윤심덕의 ‘사의 찬미’로 편곡돼 알려진 곡이다. 무대엔 남녀가 나와 3박자에 맞춰 왈츠를 우아하게 추니, 반주의 박자가 더 멋지게 귀에 들어온다.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행진곡이 나오자, 호두까기병정차림의 남녀가 나와 발레와 팬터마임을 곁들여 한층 흥을 돋운다. 마지막은 요한스트라우스 1세가 남긴 200여곡 가운데 제일 유명한 라데츠키 행진곡이다. 오스트리아의 영웅 요제프 라데츠키에게 헌정했다는 곡이다. 남녀의 짧은 무언극과 노래 끝에 단원 모두의 후렴합창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모처럼 눈과 귀가 한껏 고상하게 호강했다. 상류사회(?)의 일원이 된 느낌에 젖었다가 밖에 나와서야 아쉽게 현실로 돌아왔다. 내 생애 또 하나의 인상적인 밤이었다.
새벽산책은 낯 섬을 즐기는 일상이 돼, 오매불망(寤寐不忘)그리던 빈의 동네 탐험에 나섰다. 집들이 창가와 화단에다 어쩜 그리 예쁘고 조화롭게 꽃들을 배치시켰는지 놀랍다. 골목의 에움길을 도니 대로다. 이색적인 사실 하나! 길던 짧던 건널목마다 보행자가 건너다 중도에 기다릴 수 있는 섬 같은 공간이 확보돼있다. 도로 폭은 무지 더 넓음에도 사인에 맞추려면 바쁜 뉴욕에 비하면, 합리성이 적용된 착한 시행정이다.
어젯밤 빈의 중심가를 지나면서 가이드가 “저게 오페라하우스고 저 건물이 국회의사당입니다”했다. 차창을 통한 번개면접이라, 극장에서 예고편만 보고 본 영화는 생략한 채 나오는 격이었다. 다행히 말발굽형의 링 안 즉 빈의 심장부를 가이드의 인솔로 걷게 됐다. 예전엔 링 안쪽만 수도였단다. 허긴 우리도 옛 시대엔 4대문 안에만 한양이 아니었던가.
웅장한 석조건물들이 양쪽으로 포진한 큰길 한가운데 빨간 전차! 완전 19세기 영화의 한 장면이다. 허긴 박물관급인 빈엔 박물관이 200여개라지.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를 염원, 파르테논 신전을 본 땄다는 국회의사당이다. 위용은 대단하고 멋진데 정작 이 나라의 의회수행내용은 어떨까? 우리 여의도의사당은 쓴웃음 나오게, 오직 건물외양만 멋진데.
시청사의 좌측은 1883년 완공된 빈 대학인데 무슨 궁전인줄 알았다. 오벨리스크 탑 위에 황금빛날개를 펼친 화려한 천사상이 어쩐지 지성의 요람과는 거리가 있게 다가와서다. 유럽의 유서 깊은 대학교정스타일정석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계속>
<
방인숙 / 수필가>